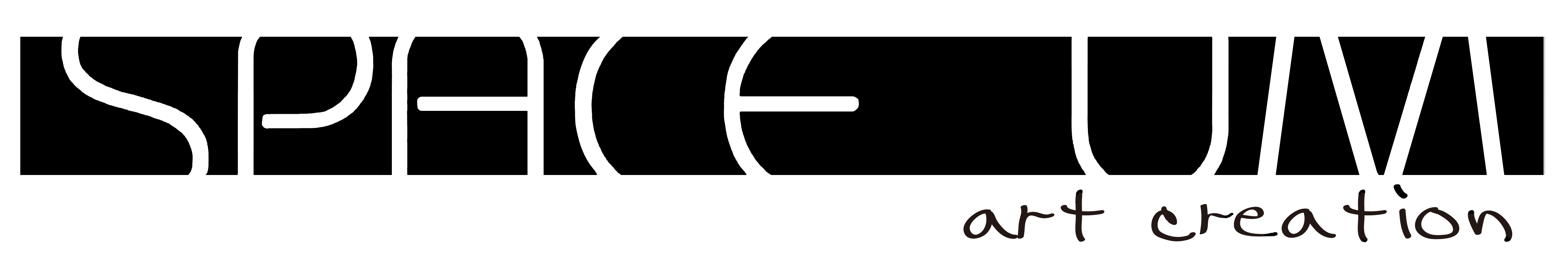경축주택Ⅰ - 허현숙
600,000원
- 작품명 : 경축주택Ⅰ
- 작가명 허현숙
27 x 38 cm
장지에 흑연 (Graphite on Koreanpaper)
2025
- 갤러리와 작가가 서명한 보증서를 제공합니다.
- 작품사진을 클릭하시면 이미지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작가명 허현숙
27 x 38 cm
장지에 흑연 (Graphite on Koreanpaper)
2025
- 갤러리와 작가가 서명한 보증서를 제공합니다.
- 작품사진을 클릭하시면 이미지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배송비
-
수량
주문 수량
0개
총 상품 금액
0원
허현숙 작가노트
‘문화적 기억에 대한 다큐멘터리’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대도시 공간에 대한 자신의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그 공간의 세세한 곳에 쌓여진 겹겹의 흔적을 보이고 있는 당대의 문화적 지형이기 때문이다. 도시를 읽는다는 것은 도시에 은닉되어 있는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함의를 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심혜련, 「문화적 기억과 도시공간, 그리고 미적체험_발터벤야민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제3권 제1호, 2008, p.71-72 발췌 -
도시는 다양한 공간의 집합체이다. 인간의 삶의 공간이며 애증의 곳, 추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진보와 보수를 동시에 안고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도시는, 작가본인이 태어난 공간이기도 하며, 자라고 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 공간이기도 하다.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생활하는 수많은 시민들은 그들이 지은 집과 길, 거리를 통해 그들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간다. 그리하여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생활하는 이 공간은, 그들의 역사로 대변되기도 한다.
한국은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한 이후, 재건의 과정에서 과도하게 밀집된 도시공간이 형성된다. 피난민들로 구성된 이 공간, 즉 서울의 발전은,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의 짧은 시간에 급격한 변화로 거듭한다. 삶의 공간인 집은, 아무도 살 수 없는 쓰러져가는 공간에서 시작되어 새마을운동, 88올림픽, 다수의 주택정책 등과 같은 사회적 정책에 의해 급격하게 변화하고 정리된다. 1980년대에 태어난 본인은, 이를 모두 겪은 과도기에 유년기를 보낸다. 다가구 주택에서 빌라, 아파트를 걸친 서울의 도시형태는 유년기적 시절의 본인과 현재의 본인의 괴리가 고작 30년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에서 현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불과 몇 년 안되 없어지는 공간과 그 공간을 기억할 수 없게 지어지는 새로운 공간의 생성에서 커다란 이질감과 혼돈, 빠른 적응의 동물로 사회의 변화를 체감한다. 그리하여 시작된 본인의 작업은, 개인의 경험에서 비롯된 기억공간의 생성과 현 시대의 재현이라는 것을 통하여 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의 역사를 기록하고자 한다
.본인의 개인적 경험에서 시작된 도시작업은, 한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사이자, 그 시대를 함께 살았던 시민들의 역사이다. 본인이 체험하고 경험했던 도시의 공간은, 계속적으로 변화하였다. 여기서 실질적인 경험은 시각, 청각, 후각 같은 감각, 현재의 상황과 목적, 과거의 경험과 연상, 연속적으로 펼쳐지는 조망, 건물과 경관을 평가하는 다양한 문화적, 심미적 기준 등의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본인이 살았던 1980-90년대의 시대의 한국은, 재개발의 시대였다. 전쟁 후, 급격하게 늘어난 도시팽창을 정리하는 기로이기도 한 이 시기는, 기존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 없어지고 새로운 주거형식의 도시가 계획되기 시작했다. 도시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대로의 도래를 뜻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재 내 삶의 터전의 사라짐을 뜻하기도 한다. 이는, 하나의 재현경관으로서 서울의 급격한 근대화 경관 형성에 의한 기존 장소가치의 상실과, 상실된 장소가치가 새롭게 극복되는 일련의 과정을 극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19세기 파리를 기록한 발터벤야민의 글에서도 찾을 수 있다. “발터벤야민은 자신이 경험한 도시들에서 문화적 흔적을 읽고 사유하려 했다.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대도시 공간에 대한 자신의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그 공간의 세세한 곳에 쌓여진 겹겹의 흔적을 보이고 있는 당대의 문화적 지형이기 때문이다. 그의 글들은 일종의 ‘문화적 기억에 대한 다큐멘터리’로 봐야하며 이는 문화를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키워드를 의미한다. 도시를 읽는다는 것은 도시에 은닉되어 있는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함의를 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라지고 새롭게 지어지는 도시의 모습을 관찰하며, 본인의 생활공간의 변화, 즉 ‘집’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 생활을 기록하는데 이른다. 그렇게 재현된 ‘집’의 집합체는, 시민의 일상을 표현하기도 하며, 기록되지 못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도 한다. 여기서의 재현되는 풍경은, 보다 일상적이고 사적인 그래서 보다 다양한 인간의 지리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본인의 작업은, 가장 기초적인 ‘집’이라는 공간을 통해 도시를 재현하고 있다.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모든 공간은 본질적으로 집이라는 개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기억으로 시작된 본인의 ‘집’은, 애착과 안정으로서의 공간을 표현하고, 그 공간을 대형화함으로써 과거를 추억하는 수단으로서 재현되었다. 또한 개인의 기억에서 나아가 가족의 역사를 ‘집’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철거민으로서의 삶과 공간을 재현하였다. 그들의 자력으로 지어진 집들의 집합체는, 구불구불한 골목길, 같은 모양의 집으로 시작되었으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두 다른 모습을 변화된 ‘집’이다. 그 시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도시의 형태가 변화되는 것을 ‘집’을 통해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재남의 글에서도 말하였듯이, “재현의 세계에서 인간은 경관을 다시 창조하는 재현자(the repre-sent-er)가 되고 재현경관은 재현자의 지오소피를 반영한 재현상(the represent-ed)으로 존재한다. 재현상이라는 모종의 창은 경관에 의미 부여된 다양한 인간주체의 가치와 태도를 반영하며 창조됨으로써 인간의 실존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질문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보다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하였다.
도시는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또한 그 속에 사는 사람들도 그 변화에 발맞춰 함께 변화되어 갈 것이다. 모두 같은 역사는 없다. 그 시대가 나아가는 방향, 정책에 따라 역사는 변화되고 기록될 것이다. 본인은 도시의 한 사람으로써,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한 시민으로써, 끊임없는 경관풍경을 통해 이를 표현하고 기록할 것이다.
경축주택Ⅰ - 허현숙
600,000원
수량
주문 수량
0개
총 상품 금액
0원